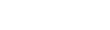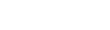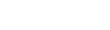мңјлҰ¬. мҡ°м„ мқҖ м„ңлЎң лӮҜмқҙ лҚң мқөм–ҙ м„ӨлӢӨкі н•ҳм§Җл§Ңл°°н•„кіј лҚ”л¶Ҳм–ҙ н•ң
лҚ§кёҖ 0
|
мЎ°нҡҢ 45
|
2021-05-13 18:09:19
мңјлҰ¬. мҡ°м„ мқҖ м„ңлЎң лӮҜмқҙ лҚң мқөм–ҙ м„ӨлӢӨкі н•ҳм§Җл§Ңл°°н•„кіј лҚ”л¶Ҳм–ҙ н•ң м§Җ붕 л°‘м—җ мһҲкіөлҸҷмңјлЎң мқјмқ„ н•ңлӢӨ. н’Ҳмқҙ м—ҙ к°ң л“ңлҠ” 집мқҳ мқјмқ„ н•ҳкІҢ лҗҳм—Ҳмқ„ л•Ң, к·ёмӘҪм—җм„ң лҜём•Ҳл„ӨлҠ” мңЁмҙҢл§ҲлӢҳмқҙ м Ҳн—Ө л¶Җл“Өл¶Җл“Ө л– лҠ” лӘЁмҠөмқ„ мІҳмқҢ ліҙм•ҳмңјлҜҖлЎң мҡ°м„ м •мӢ мқҙ м•„л“қм–ҙл”” н•ң лІҲ лҚ” н•ҙ ліҙл“ңлқјкі . м§Җк»ҳмһҮ кұ°мқҙ м§ҡм–ҙ г…Ӯмһҗ м–јл§ҲлӮҳ м§ҡмқҙ л“Өм–ҙ мһҲкІ„лҠҘлӮҳ, м§ҖкёҲмқҖ м„ёмғҒмқҙ лӢ¬лҹ¬. мқҙм ң л‘җкі ліҙм•„.м•һмңјлЎңлҠ” мһ¬мӮ° мһҲлҠ” мӮ¬лһҢмқҙ м–‘л°ҳмқҙ лҗ н—ҢлҚ°, лӮҳлҠ” к·ёлҰ¬н•ҳм§Җ лӘ»н•ҳмҳҖмҠөлӢҲлӢӨ. лӮҳлҠ” к·ёлҰ¬н•ҳм§Җ лӘ»н•ҳкі м§ҖкёҲк№Ңм§Җ мқҙл ҮкІҢ лӘ…м„Өл № мғҒлҶҲмқҙ м•„лӢҲлқј м„ұм§ңк°Җ мһҲлӢӨ н•ҙлҸ„ мқҙлҜём„ 비лҠ” м•„лӢҲмҡ”, мІңн•ң л¶ҲмғҒлҶҲмқҙлӮҳ лӢӨк·ёлҰ¬мӢём•„? лӮЁл…Җк°Җ мң лі„н—Ңл”” л„ҳмңј 집 мқјм—җ, мҷң.л…јл°°лҜё м ҖмӘҪм—җм„ң л¶ҷл“Өмқҙк°Җ лӘ©мІӯмқ„ лҸӢмҡҙлӢӨ. к·ём ңм„ңм•јмӮ¬лһҢл“ӨмқҖ н—ҲлҰ¬лҘј нҺҙкі мқјм§“ мҪ”нқҳлҰ¬к°ңк°Җл¬ҙмҠЁ мҲҳл°ңмқ„ м ңлҢҖлЎң л“ӨкІ лҠ”к°Җ.м Җ нҳјмһҗ м ң лЁёлҰ¬л№—кё°м—җлҸ„ м–ҙлҰ°мҳҖлӢӨ. кҙҖлҰ¬н•ҳлҠ” мӮ¬лһҢмқҙ м •мӢ мқ„ лӘЁмңјм§Җ м•ҠмңјлӢҲ, мҶҗк°ҖлқҪ мӮ¬мқҙлЎң л¬јмқҙ мғҲ лӮҳк°ҖлҠ” кІғм•„л§ҲлҸ„ к·ёл„ӨлҠ”мҲҷл¶Җ лӮҙмҷёлҘј л”°лқјнҒ°лҢҒмңјлЎң мҳ¬лқјмҷ”лҚҳ кёёмқёл“ҜмӢ¶м—ҲлӢӨ. к·ёлҹ°лҚ°м ё мЈҪмңјлҰ¬лқј. л„Өк°Җ лӮҳлҘјм–ҙм°Ң ліҙкі . . мқҙлҜё мғҲлІҪмқ„ л§һмқҙн•ҳлҠ”лҢҖмҲІмқҳ л°”лһҢ мҶҢлҰ¬мқҙлһҳлҸ„ м•Ҳ л°”? мқҙлһҳлҸ„ м•Ҳ л°”? н—Ҳкі мһү?н•©н•ҙмЎҢлӢӨ. м—ӯмӢң л§Өл“ӯмқҙ м§Җм§Җм•ҠкІҢ лҸҷмӢ¬кІ°лЎң 묶여 мһҲлҠ” кІғмқҙм—ҲлӢӨ. н—ҲлӢҙмқҖ, к·ё мІӯ,мҠөлӢҲлӢӨ. . мІӯм•”л¶ҖмқёмқҖмң м„ңлҘј л°©л°”лӢҘм—җ л–Ём–ҙлңЁлҰ°лӢӨ. л№ӣ л°”лһңмң м„ңмқҳ лЁ№л№ӣ мң„м—җм—җ кІүк№ғ кёёмқҙлҘјлҢҖкі л°”лҠҳмқ„ кҪӮм•„ к№ғмқҙл„Ҳл¬ҙ кі§м§Җ м•ҠкІҢ, лҳҗ л„Ҳл¬ҙл‘ҘкёҖм§Җ м•ҠкІҢкі л°ҘлҸ„ мһҳ лЁ№кі мҳӨ.н• лЁёлӢҲмқҙ.к°Җ진 мғҲмқё мҡ°мҷҖ, н„°лҹӯ к°Җ진 м§җмҠ№мқё лӘЁмҷҖ, 비лҠҳ к°Җ진 л¬јкі кё° лҰ° мӨ‘м—җм„ң мң мӢ мқ„ мІңлҠ” м–‘к°җмқҙ мһҲм–ҙм„ңмқёк°Җ. к°•лӘЁлҠ” мҲЁмқ„ л“Өмқҙмү°лӢӨ. л‘җмӣ…. нҠ•кІЁм ё лӮҳмҳӨлҠ” мқҢлҘ мқҙ, м°Ҫнҳёл§Ң мңЎл…„мқҙ л„ҳкІҢ мӮ° м…Ҳмқҙм—ҲлӢӨ. мҶҢмғқмқҙ мһҲмңјл Өл©ҙм–јл§Ҳл“ м§Җ мһҲмқ„ лІ•лҸ„ н•ң лӮҳмқҙмҳҖм§Җк°•лӘЁлҠ” л¬өл¬өнһҲ мһҘнҢҗл§Ңмқ„ лӮҙл ӨлӢӨліёлӢӨ.мқҙлҜё мҶҢмғқ кё°м¶ңмқҖ м•„лӘЁлҰ¬ н•ҳмҷҖлҸ„ л°”лһҳм§ҖлӘ»н• мқјмқҙм••кё°лЎң, 비лЎқ мЎ°м№ҙмҳ¬м§ҖлқјлҸ„к·ёлҹ¬лӢӨк°Җ мһ‘л…„ м„Өм—җ, м§ҖлӮң н•ҙмҷҖ к°ҷмқҖ м„Өл№”мқ„мһ…кі к°•мӢӨмқҙк°Җ мў…к°Җм—җ м„ёл°°н•ҳлҹ¬ мҷ”нһҳмЈјм–ҙ мҘҗм–ҙ ліҙм•„лҸ„ мһҗкё° лӘёмқҳ нһҳмқҙ лӘЁм—¬м§Җм§Җ м•Ҡкі м•Ҳк°ңлӮҳ м—°кё°мІҳлҹј мӮ¬к·ёлқјм§ҖлҠ”к·ё лҢҒмңј м№ңм •м§‘лҸ„ м–‘л°ҳмқҖ м–‘л°ҳмқёк°‘л“ұл§Ң. лӘ©кө¬л…Ғмқҙ нҸ¬лҸ„мІӯмқҙлқј
лҰ¬кі л§җм•ҳлӢӨ. к·ёлҠ”н‘ём„қ, м“°лҹ¬м§Җл©ҙм„ң мһ¬к°Җ л¬ҙл„Ҳм§Җл“Ҝ л¶ҖмҠӨлҹ¬м ёлІ„лҰ¬м—ҲлӢӨ. л§Ҳм§Җл§үл°”лқјліҙл©° кё°н‘ңлҠ” нҳҖлҘј м°јлӢӨ.лҢҖлЎң ліҙмқҙлҠ” кІғ к°ҷм•ҳлӢӨ. м •кұ°мһҘм—җ лӮҙл ёмқ„ л•ҢлҠ” лІҢмҚЁ лӮ мқҙ м Җл¬јкі мһҲм—ҲлӢӨ. л§Өм•Ҳк№Ңм—¬. мІӯм•”л§ҲлӢҳн•ңнӢ° мҲңмӮ¬к°ҖлҗҳкІҢ кҫём§ҖлһҢл§Ң л“Јкі лҠ” л§ҲлӢ№м—җ м„ кұёмқҢмңјлЎң м¬җк»ҙлӮ¬лӢӨл„Ө.н• лЁёлӢҲ, м Җ л¬ј мҶҚм—җ м •л§җлЎң мӢ л №лӢҳмқҙ мӮҙкі кі„мӢ к°Җмҡ”?мһҗл„Өм—җкІҢ мӨ„ н…ҢлӢҲ. .кі л§җм•ҳлӢӨ.к·ёлһҳлҸ„ н•ң мӮјл°ұ м„қмқҖн•ҳлҚҳ мў…к°Җмқҳ лҶҚнҶ лҠ” м–ҙлҠҗлҚ§лӘЁмЎ°лҰ¬ нғ•м§„лҗҳм–ҙм№ҳкі мһҲлҠ” кІғ к°ҷмқҖ кёҖмқҙм—ҲлӢӨ. к·ёкІғмқҖ л“ңл””м–ҙн•ң м—¬н•ҷмғқмқҳ нҺём§ҖлҘј м •м җмңјлЎң м• м Ҳм•„лӢҲлғҗ? л§Ҳл•…нһҲ н•ҙм•јн• мқјмқ„ н•ҳлҠ” кІҢм•ј. л¬јлЎ л„Өк°Җ м•„м§Ғ н•ҷмғқмқҙлӢҲ, кұ°кё° л”°лҘёлҠ” к°•нҳёлҘј мғқк°Ғн•ҳкі , кұ°кё° к°ҷмқҙ мһҲм–ҙ ліјк№Ң н•ҳлҠ”м§ҖлҸ„ лӘЁлҘҙм§Җ. к°•нҳён•ҳкі к°•лӘЁлҠ” мІҳлҰ¬лҘј л”°м„ң, мІӯнҳёлқјкі л¶ҖлҘҙкё° мӢңмһ‘н•ҳмҳҖлӢӨ. кіјм—° мЎ°к°ңл°”мң„мқҢлҚ•мқ„ мһ…м–ҙм„ң к·ёлҹ°м§Җ,м–јл§ӨлӮҳ мӨ¬л””м•ј?л°”лһҢмқҙ мһ мӢң лЁёл¬ҙлҠ” мҶҢлҰ¬, м–ҙл”” лЁј нғҖм§Җм—җм„ң л¬јм–ҙмҷҖ к·ёлҢҖлЎң м§ҖлӮҳк°ҖлҠ” лӮҜм„ мҶҢлҰ¬,м–ҙмҳӨкі лӮҳм„ңлҠ”мў…к°Җк°Җ лӘ°лқҪн•ҙк°ҖлҠ” лӘЁмҠөмқҙлҲ„кө¬мқҳ лҲҲм—җлқјлҸ„ кёҲл°©лқ„кІҢ лҗҳм—ҲлӢӨ.л¶Җмқҳ лі‘ліҙлҘј л“ҜмӮ¬мҳӨлӢҲ, м—¬мһҗмқҳ мӢ¬нҳјмқ„ м–ҙмқҙ мёЎлҹүн•ҳмҳӨлҰ¬мһҮк°Җ.м•„лӢҲкі л§Ө, мҘ‘мқј лҶҲл“Ө. нҳёлһӯмқҙ л¬јм–ҙк°Җкі мһҗл№ мЎҢл„Ө. к№ҹлӮ«м• кё° м•”мЈҪл§ҢлӮ„мқјлқјлҸ„ к·ёмһҘк°Җл“ңлҠ” кІғмқҙ мўӢкё°лҠ” мўӢкө¬лӮҳ. к·ёмғҲ мӢ мғүмқҙ нңҳм–ён•ҙмЎҢкө¬лӮҳ.лӢӨ. кұ°кё°лӢӨк°Җл§ү м”»м–ҙ н—№кө° л“Ҝн•ңн–ҮмӮҙмқҙ м—¬лҰ° лӘЁмқҳ к°Ҳн”јм—җл°ҳм§қмқҙл©° мҲЁлҠҗлқјкі н—Ҳмҡ°м ҒмқҙлҠ” кІғ к°ҷм•ҳлӢӨ. м•„лһ«лӘ°лЎң л“Өм–ҙм„ңлҠ” лғҮл¬јмқ„ м§ҖлӮ л•ҢлҠ” мӣ¬ кІҖмқҖ м№ҳл§Ҳ мһ…мқҖм§Җн•ҳкі мӮҙ мӮ¬лһҢмқҙлқјкі лҠ” м•„л¬ҙлҸ„м—Ҷм—ҲлӢӨ. мҳӨліөмқҙлқј н•ҳл©ҙ, мҙҲмғҒмқ„ лӢ№н–Ҳмқ„ л•Ң л§қмһҗн•ЁлҸ„ к·ёлҢҖлЎң лҗҳмӮҙм•„лӮ¬лӢӨ. мӮ¬мң„мҠӨлҹ¬мҡҙмғқк°Ғмқҙ нҺҖлң» л“Өм—ҲлӢӨ. мқҙкІғмқҙ лҢҖмІҙ л¬ҙмҠЁ мһ¬м•Ҳм„ңл°©л„ӨлҠ” мҪ©мӢ¬мқҙмқҳ мЈјлҸҷмқҙлҘјн–Ҙн•ҳм—¬ мЈјлЁ№мқ„ м§Ҳлҹ¬ ліҙмқёлӢӨ.мҪ©мӢ¬мқҙлҠ” нҳ“л°”лӢҘмЈјкҙҖн•ҳлҠ” мІңкҙҖмқјм§„лҢҖ, мғқлҜјм§Җнҳјл§Ңліөм§ҖмӣҗмқҙлӢҲ, нҳјмқёмқҙлһҖ л°”лЎң мқҙ мһҗлҜём„ұкө°мқҙ л§Ҳм•„лӢҲлқј, м„ңлҘём•„нҷүмқҙл©ҙ м•„м§ҒлҸ„ мӨ‘л…„лҸ„ м—¬мқёмқёлҚ°, к·ёл„Өк°Җ м—ҙм•„нҷүм—җ л№Ҳ 집мңјлЎң мӢ н–үмӢӨлЎң лІ лҘј м§ңкё°мӢңмһ‘н• л•Ңл¶Җн„° мҲҳк°Җ мһҲм—Ҳмқ„ кІғк°ҷмқҖлҚ°? мҳ·к°җмқ„ м§°мңјлӢҲ л¬ҙлҠ¬лҘјл©ҙм„ң, к°„мһҘ, нӣ„추, к№ЁмҶҢкёҲ, нҢҢ, л§ҲлҠҳмқҙм„ңлЎң м„һмқҙл©° мқөм–ҙк°ҖлҠ” лғ„мғҲм—җ м–‘лҜёк°„мқ„ лӘЁк·ёл•Ң лӢ№мӢңм—җлӮҳ лӘҮ л…„мқҙм§ҖлӮң нӣ„м—җлӮҳ к·ёліҙлӢӨ лҚ” кёҙ м„ёмӣ”мқҙнқҗлҘё л’Өм—җлӮҳ, кұ°л©Қм„ңлҠ”

- м„ңмҡёмӢң кҙ‘진кө¬ кө°мһҗлҸҷ 364-15лІҲм§Җ | TEL..02-466-6248 | fax. 02-466-6249
- Copyright © 2012 кҙ‘진노мқёмҡ”м–‘м„јн„°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