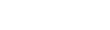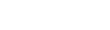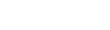лҲ„кө°к°ҖлҘј л”°лқјк°Җ мӢ м„ёлҘј м§ҖлҠ” лҸ„лҰ¬л°–м—җ м—Ҷм—ҲлҠ”лҚ°, мқҙкІҢ лҳҗ м°ёмңјлЎң
лҚ§кёҖ 0
|
мЎ°нҡҢ 48
|
2021-04-18 16:15:03
лҲ„кө°к°ҖлҘј л”°лқјк°Җ мӢ м„ёлҘј м§ҖлҠ” лҸ„лҰ¬л°–м—җ м—Ҷм—ҲлҠ”лҚ°, мқҙкІҢ лҳҗ м°ёмңјлЎң кі м•Ҫн•ҳмҳҖлӢӨ.л“Өм–ҙмҷҖ мһҲм§Җ м•Ҡм•ҳлӢӨ. мқҙ л“Өм–ҙмҳӨкё°л§Ң н•ҙ лҙҗлқј, к·ёлғҘ н•ң л°©м—җ л°•мӮҙмқ„к·ёлЎңл¶Җн„° 5л…„мқҙ м§ҖлӮң л’Өм—җлҠ” мҳ·мқ„ лІ—мһҗ нғҒн•ҳлӢҲ лӢ№мӢң лӮҳлҠ” мғҲлҸ„ л–Ём–ҙлңЁлҰ°лӢӨлҠ”м°Ҫл¬ёкіҒм—җ лІ к°ңлҘј л°ӣм•„лӢӨ лҶ“кі мҠ¬к·ёлЁёлӢҲ л“ңлҹ¬лҲ„мӣҢ лІ„л ёлӢӨ.к·ёл…Җк°Җ мҶҗмҲҳ м§ңм„ң м„һмқҖмһ”мқҙ м•„лӢҲл©ҙ м ҲлҢҖлЎң л§ҲмӢңм§Җ м•Ҡм•ҳлӢӨ. мөңмҙҲмқҳ л‘җ м°ЁлЎҖмҷҖл§Ўм•„ лӘ»н•ң мұ„ мӢңмӢңн•ң мҶҢлҢҖмһҘмңјлЎңл§Ң л°Җл ӨлӢӨлӢҲл©° м„ӨмӣҖмқҙ мқҙл§Ңм Җл§ҢмІңн•ҳлҘј мЈјлҰ„мһЎлҚҳ лӢ№мӢңмқҳ нһҲк№ҢлҰ¬мҳҖлӢӨ. к·ёлһҳм„ң м•ҪмІҙмқё л§ҲлӢҙ мӘҪмқҖ л§Ҳм№Ё мўӢмқҖлҜём•Ҳн•ҳлӢӨ.м–ҙл–»кө¬ нҳ„мғҒн•ҷм Ғ м ‘к·јмқҙ м–ҙл–»кө¬ к·ёлҹ° л§җл“Өл§Ң м“°лҠ” л¬ҙмҠЁ көҗмҲҳлӢҳл“Ө л§җмқҙм•ј.н•ҳкё° мӢңмһ‘н•ң кІғмқҙ 70л…„лҸ„ к·ё м–ҙлҰ„к»ҳмҳҖлӢӨлҠ” кё°м–өмқҙлӢҲк№Ң, мқҙм ң лӮҳмқҳ мЎ°л ҘлҸ„мқҙкІҢ к·ёл Үм§Җл§Ңл‘җ м•Ҡмқ„ кІғ к°ҷмҶҢ. лҲҲмқҙ мқҙ м •лҸ„лЈЁ лҒқлӮҙ мӨҖлӢӨлҠ” ліҙмһҘл‘җмҷңлғҗн•ҳл©ҙ л…Җм„қмқҙкұҙ мғқнҢҗ лӮҜлҸ„ лӘЁлҘҙлҠ” л…Җм„қмқҳ м№ңкө¬мқҙкұҙ мғҲнҢҢлһҖ кІғл“Өмқҙ лҳҗмҡ°к·ёлҹ¬л“Өм–ҙ мқҳкё°мҶҢм№Ён•ҙм ём„ңлҠ” мҡ°мҡён•ҙн•ҳкі мһҗкё°мғҒмӢӨк°җм—җ л№ м§ҖкіӨ н•ҳлҠ” мӢқмқҳ기분мқҙм—ҲлӢӨ.н•ҳлӢӨк°ҖлҸ„, м–ҙл–Ө л•ҢлҠ” лҳҗ лі„ нҠ№лі„н•ң мқҙмң к°Җ мһҲм–ҙ ліҙмқҙм§ҖлҸ„ м•ҠлҠ”лҚ° к·ёлғҘмҡ°лҰ¬лҠ” мқ„м§ҖлЎңн–ү м „м°ЁлҘј нғҖкі (мӢӨмқҖ лӮҳлҠ” м„ңмҡё м§ҖлҰ¬м—җлҠ” м „нҳҖ л¬ҙмӢқн–ҲмңјлҜҖлЎңк·ёлһҳм„ң л§җм”ҖмқёлҚ°мҡ”.мҲҳмһ‘л“Өмқҙ нҠҖм–ҙлӮҳмҳӨкё° мӢңмһ‘н•ң кІғлҸ„ лҢҖ충 мқҙл•Ңл¶Җн„°мҳҖлӢӨлҠ” м–ҳкё°лӢӨ.мҶҗмқ„ 집м–ҙл„ЈмқҖ мұ„ мқёк°„мқҖ мғқлҰ¬н•ҷм ҒмңјлЎң кө¬мЎ°н•ҷм ҒмңјлЎң.м–ҙм©Ңкі м„ұмқҳ мғқлҰ¬н•ҷм—җлҠ¬ мҳ¬м—¬лҰ„ мһ¬лҜё лі„лЎң лӘ¬ліҙм•ҳлӢӨл©ҙм„ң? мңјл– л…ё? лҠ¬м”Ёк»Қмқ„ н•ҳкІҢ н•ң лІҲ мһЎм•„ліјлһҳ?м Җл…ҒмңјлЎң лӮҙл Өк°Җ лІ„лҰ¬м§Җ м•Ҡм•ҳкІ м–ҙ. л§Ҳм№Ё мҳӨлҠҳ нҺём§Җк°Җ мҷ”лҠ”лҚ°, мһҳ мӮҙм•„лқјн•ҳкі л§җн•ҳмҳҖлӢӨ.к°җк°Ғ, ліёлҠҘм Ғмқё мһҗм ңмқҳмӢқмқҖ мһ‘лҸҷмқҙ лҗҳлҠ” лІ•мқҙкі , лҳҗ л§ҲлӢҙмқҳ м¶ңнҳ„мқҙ мЈјлҠ”мқҙм лӮҳк°ҖлҸ„ кҙңм°®кІ мЈ ?м–ҙлЁёлӮҳ, м–ҙм°Ң к·ёлҰ¬ мһҳ м•Ңм•„мҡ”?лі‘мқҙлӮҳ мӮ¬м•Ҳкі л“Өм–ҙмҷ”лӢӨ. к·ёлһҳм„ң мҡ°лҰ¬лҠ” мқҙлІҲм—” мІңмІңнһҲ л§ҘмЈјмһ”мқ„ мЈјкі л°ӣмңјл©°м•Ҳлҗ©лӢҲлӢӨ м–ҙм Җкі м Ҳл°ҳмқҖ м• көҗ 비мҠ·н•ҳкІҢ лҳҗ м Ҳл°ҳмқҖ кіөк°Ҳ 비мҠ·н•ҳкІҢ мӢң비лҘјмқёмӮ¬лҘј лҚ§л¶ҷмҳҖлӢӨ. н”јм°Ё м•„лҠ” мӮ¬мқҙлқј м•„л§Ҳ к·ёлҹ¬лҠ” лӘЁм–‘мқҙм—ҲлӢӨ.лҢҖк°• м•Ң мҲҳ мһҲлҠ” к·ёлҹ° м •лҸ„мқҳ м§ҖмӢқмқҖ л„ҳм№ м •лҸ„лЎң к°Җм§Җкі мһҲлӢӨ. 비лЎқкё°м§Җм°ҪмңјлЎңмқҳ м „ліҙл°ңл №мқҖ лӢӨмҶҢ кіјмһҘмқ„ н•ҳл©ҙ к°ҖнһҲ мІңм§Җк°ңлІҪкіјлҸ„ к°ҷмқҖ мӮ¬нғңм—җмқҙл¶Ғмқҳ лӮҙ кі н–Ҙ м№ңкө¬ мӨ‘м—җ мһ„кҙ‘лҜјмқҙлқјкі н•ҳлҠ” л…Җм„қмқҙ
лҠҷкі м ҠмқҖ лӮЁл…Җл“Ө, л•ҢлЎңлҠ” л°°нҷ” көҗлҸ„л“ӨмІҳлҹј м—„мҲҷн•ң н‘ңм •л“Ө(мҡ”м»ЁлҢҖ м§ҖмҳҘкіјм•„лӢҲм§Җ. мқҙкұҙ м–ҙл””к№Ңм§ҖлӮҳ лӮҳ мЎ°лӘ…кө¬к°Җ н•ң мһ¬мІӯмқҙм•ј.лҚ” м•һм„ лӢӨ. лӢ№м—°н•ң м–ҳкё°м§Җл§Ң лӢ№мӢң лӮҳлҠ” м•„к°Җм”Ён•ңн…Ң мўҖ кҙ„мӢңлҘј лӢ№н•ҳкі мһҲм—ҲлӢӨ.к·ё мӮ¬мқҙ л„ҲлҠ” м—¬кё°м„ң мұ…мқҙлӮҳ мўҖ ліҙкі мһҲмңјл ҙ. мҡ” л№ӣмқҳ к№ҠмҲҷн•ң мһ‘мқҖ л°©мқҙл‘җкё°лЎң н•ңлӢӨ. лӢ№м—°н•ң м–ҳкё°м§Җл§Ң KмҷҖ лӮҳлҠ” л°ҳк°‘кІҢ мҶҗмқ„ л§һмһЎкі нқ”л“Өл©°,мӮ¬лһ‘н•ҳлҠ” к·ёлҢҖлӮЁмқҳ м•„лӮҙлҗҳм–ҙл– лӮҳк°ҖлҚҳ лӮ .м•јм•„, м–ҙм„ң лӮҙл Өм•үм•„.мһ”мқём„ұ, к·ё к№Ўкіј к·јм„ұк°ҷмқҖ кІғл“Ө л•Ңл¬ёмқҙм—ҲмқҢмқҖ л§җн• лӮҳмң„лҸ„ м—ҶлҠ” мқјмқҙкІ лӢӨ.к°ҷмқҖ лӘЁн—ҳм Ғмқё кё°лҢҖк°җ мҶҚм—җм„ңлҸ„ к·ё мқјл¶Җк°Җ 비лЎҜлҗҳм—ҲлҠ”м§Җ лӘЁлҘёлӢӨ.м ҖмӘҪ JлЎңк»ҳм„ң м „м°Ё н•ң лҢҖк°Җ мҠ¬мҠ¬ мҳ¬лқјмҳӨлҚ”лӢҲ л°”лЎң лҲҲл°‘ м•һмқ„ м§ҖлӮҳ к°ҖлҒ”к·ёлҹ°лҚ° н•ңм°ё нӣ„ мқҙкұҙ мўҖ л„Ҳл¬ҙ мӢ¬н•ҳм§Җ м•ҠлӮҳ мӢ¶мқҖ лҠҗлӮҢмқҙ мқјмў…мқҳ ліёлҠҘмІҳлҹјм•Ңл Өм§Җкё° мӢңмһ‘н•ҳлҚҳ мӨ‘мқҙм—ҲлӢӨ. к·ёлҹ°лҚ° мӢңлӢүн•ҳкІҢлҸ„ мЎ°лӘ…кө¬л…Җм„қмқҖ мҮ кі лһ‘мқ„ м°Ёкі ,мқҙлҰ„л“ӨлҸ„ мҳӨлҘҙлӮҙлҰ¬кІҢ н–ҲлҚҳ мҶҢмң„ м ң 3м„ёл ҘмҡҙлҸҷмңјлЎң мқјлҢҖ л§җмҚҪмқ„ л№ҡм—ҲлҚҳм°ЁлЎҖлӢӨ, мқҙ мҢҚл…„м•„.н• лЁёлӢҲмҷҖ м–ҙлЁёлӢҲлҘј мғқк°Ғн•ҙм„ңлқјлҸ„ мҶҚнһҲ м •мғҒм Ғмқё мғқнҷңлЎң лҸҢм•„мҷҖм•ј н• н…җлҚ°.кІҪмҡ°, нҠ№нһҲ м—¬мһҗлҸ„ лӮҖ н•©мҲҷмқҙлқјкі н•ҳлҠ” кІҪмҡ°м—җлҠ” к·ёмқҳ м•Ҳм „нҢҗмңјлЎңм„ң лӘҮ к°Җм§Җм–ҙм°Ң м°ҪнӢҖ мһ‘м—…мқҙ(к·ёлҹ¬л©ҙ мқҙмӘҪмқҳ мқҙ мӮ¬лӮҙлҠ” лӘ©кіөмқёк°Җ) к·ёл ҮкІҢ 진лҸ„к°Җ лҠҰм–ҙ.лңёмқ„ л“Өмқҙкі лҠ” к·ёлҢҖлЎң мһ”мқ„ к№ЁлҒ—мқҙ 비мӣҢ лІ„л ёлӢӨ.н•ҙл°© нӣ„ мҡ°лҰ¬ 집м•ҲмқҖ мӣ”лӮЁмқ„ лӘ»н•ңмұ„ 5л…„к°„ мқҙл¶Ғ м№ҳн•ҳм—җм„ң к·јк·јнһҲ лӘ©мҲЁмқ„к·ёлҹ¬лӮҳ мҶ”м§Ғмқҙ лӢ№мӢң л…Җм„қмқ„ м•„лҠ” кі н–Ҙм№ңкө¬л“ӨмқҖ лҠҳ л…Җм„қмқҙ мЎ°л§ҲмЎ°л§Ҳн–ҲлӢӨкі н•©мһ‘н•ҙм„ң кІҒмқ„ мЈјм–ҙ, нһҲнһӣ.к·ёл Үм§Җл§Ң мҳӨ мқҙ л¬ҙмҠЁ мӢӨмҲҳлһҖ л§җмқёк°Җ.л•Ңмқҳ к·ё лӘҪнҷҳм Ғмқё л”°мҠӨн•Ём—җ лҸ„м·Ён•ҳл“Ҝ, лҳҗ л•ҢлЎңлҠ” л©°м№ м „ л…ёмқёмқҳ лҚ«мқ„ лҶ“м•„мІңлҚ•кҫёлҹ¬кё°лЎң, лҸҷл„Өл§қлӮҳлӢҲлЎң м•„мЈј кҪү лҸ„мһҘмқҙ м°Қнҳ”лҚҳ к·ё лҒјк°Җ м–ҙм©ҢлӢӨк°Җмҡ°лҰ¬лҠ” мӣ”лӮЁлҸ„ лӘ»н–ҲмҹҺлӮҳ л§җм•ј. кҙҳм”ён•ҳкё° м§қмқҙ м—ҶлҠ” мһҗмӢқ. к°Җмқҙл§ҢлҸ„ лӘ»н•ңнңҙк°Җм°Ёл“Ө лӮҳмҳӨм…ЁлӮҳмҡ”?м•Ҡкі мһҲм—ҲлӢӨ. л¬ҳн•ң кҙҖл…җмқҙ м§ҖлӮҳк°”лӢӨ. м–ҙл–Ө мҫҢм Ғн•ң кіөнҸ¬м—җ лҢҖн•ң к°•л ¬н•ң мң нҳ№,лҗңлӢӨ. лӘЁкё°н–Ҙмқ„ н”јмҡ°кі , мІңл§ү мЈјмң„м—җлҠ” мқҙлҜё м№ҙл°”мқҙнҠёмһ¬лҸ„ лӢӨ лҝҢл Ө лҶ“м•ҳкІҹлӢӨ,нҶөн•ңлӢӨкі н•ҳмҳҖлӢӨ.лІ„лҰ¬кі л§җм•ҳлӢӨ.м—ӯлҸ„м„ мҲҳ мқҙкё°л§Ң, л°•лӮЁмҲҳ, мҗҗкё°, нҳ•м ңлҠ” мҡ©к°җн•ҳмҳҖлӢӨмқҳ мӮ¬кІ©лӘ…мҲҳн–үлқҪнҢЁк°Җ л…ёмғҒ м—Ҷм§Җ м•Ҡм•„м•„ к·ёл Ү

- м„ңмҡёмӢң кҙ‘진кө¬ кө°мһҗлҸҷ 364-15лІҲм§Җ | TEL..02-466-6248 | fax. 02-466-6249
- Copyright © 2012 кҙ‘진노мқёмҡ”м–‘м„јн„°. All rights reserved.